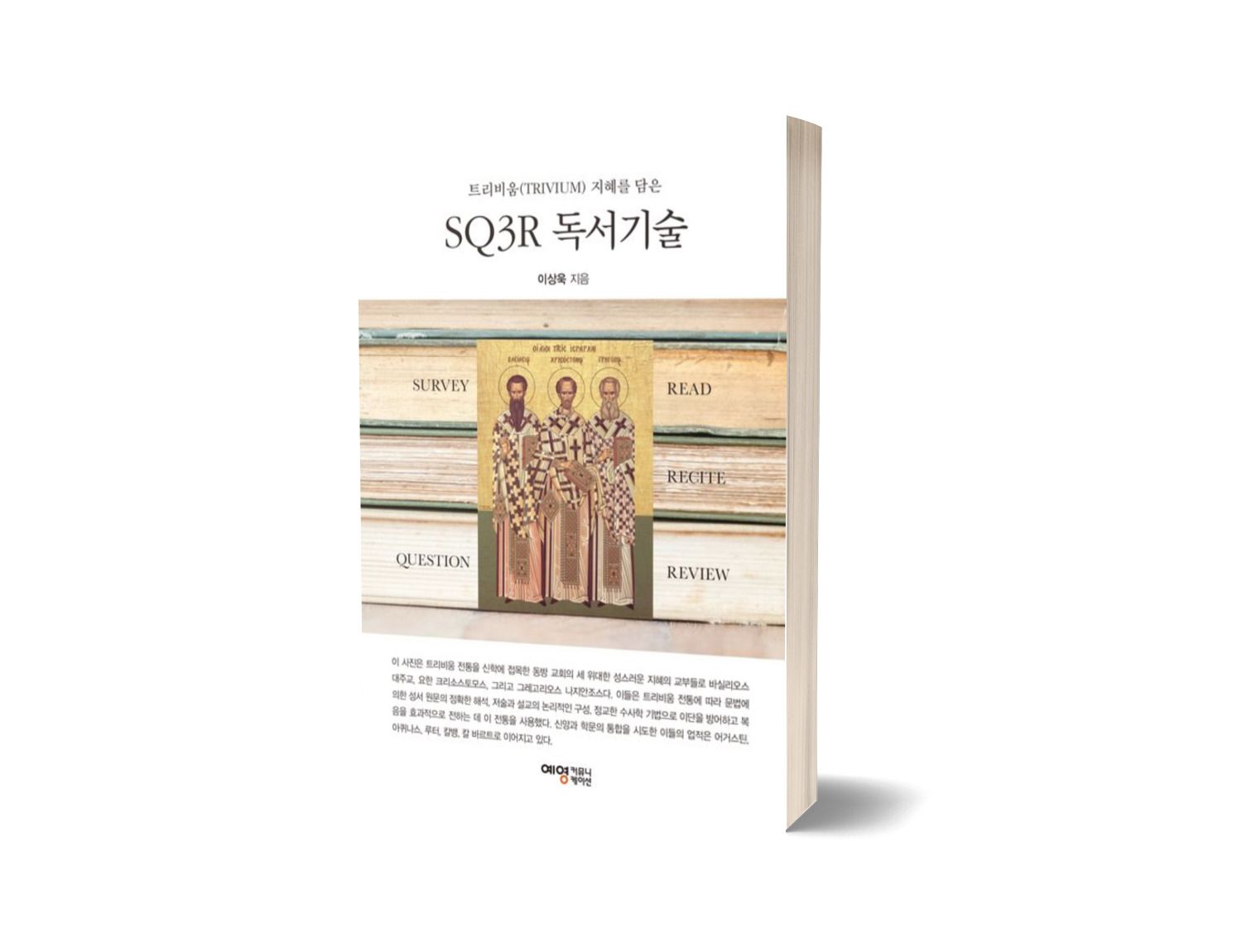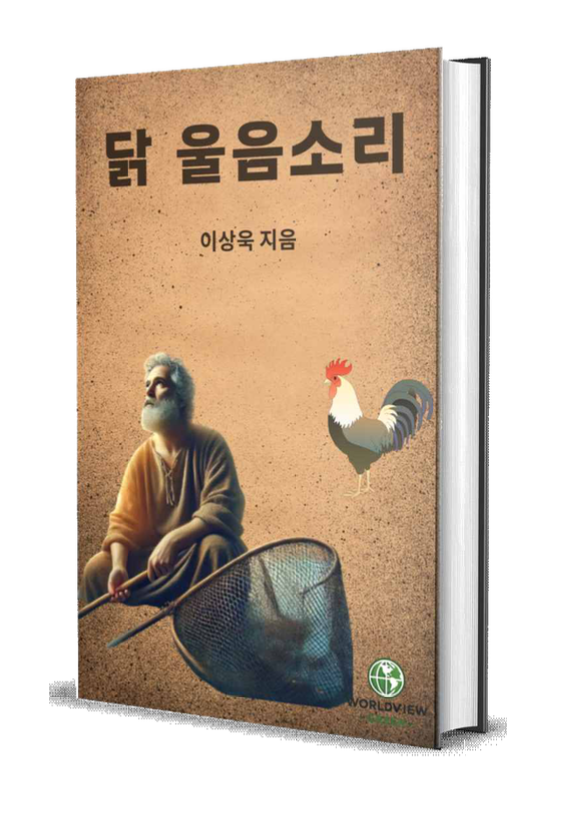사법부라는 '안식일', 누구를 위한 성역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남긴,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어떤 제도나 규칙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것이다. 신성하기 그지없는 안식일조차 그러할진대, 하물며 인간이 만든 제도인 '사법부'는 어떻겠는가?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사법부'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가?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분명하다. 법은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리고 판사는 바로 이 방패를 들고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이다. 판사에게 부여된 독립성과 권위는 이 숭고한 임무, 즉 '국민을 위한' 법치 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들 스스로가 누리는 '사법부'라는 견고한 성채 안에서의 안락한 지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안식일'은 태초부터 '국민'이라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법부의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당연한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질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회는 더 이상 견고한 구조와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진 '고체형'이 아니라, 경계가 흐릿하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액체형'으로 변모했다. 지그문트 바우만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통찰했듯이, 전통적인 권위와 위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제도가 주는 단단한 기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와 유연한 소통이 중요해졌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며, 국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사법부의 일부는 이러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이 '액체형' 사회의 흐름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즉 '집단적 망탈리티(Mentalité Collective)'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즉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깊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 감정, 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집단이 역사적 경험, 사회적 위치, 내부 문화 등을 통해 형성한 집단적인 정신 상태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망탈리티는 과거의 익숙한 질서나 가치관에 강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두려움,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쉽다.
사법부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가 권력에 부역했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성찰하고 청산하지 못한 채, 민주화 이후 누리게 된 독립성과 권위만을 고스란히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망탈리티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고체형' 사회에 익숙한 사고방식과 조직 문화가 '액체형' 사회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충돌하면서,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방패'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려는 성채 안에 갇히는 것처럼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가 폭로되었을 때,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빗장을 걸어 잠갔던 모습은, 사법부라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그 '안식일'이 섬겨야 할 '국민'을 외면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집단적 망탈리티'는 재판 과정에서도 섬뜩하게 드러날 수 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과 양심이 아닌 자신들의 편견이나 감정에 따라 사실과 가치를 뒤섞는 '도덕 재판'을 행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본래 목적했던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특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할 법과 사법부라는 '안식일'이, 거꾸로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 신뢰는 오직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때만 쌓일 수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사법부의 모든 규칙과 제도, 그리고 판사들의 양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자신들의 낡은 권위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라는 안식일'에 매몰되어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잃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최근 사법부의 모습은 스스로가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 이상 과거의 권위와 '집단적 망탈리티' 뒤에 숨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절박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복 안에 숨은 두려움과 낡은 권위의 미련을 떨쳐내고, 오직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법치의 대원칙으로 돌아갈 때, 사법부는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둥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